형광 산호초에 "예쁘다!" 탄성 지르면 안 되는 이유
[환경 다큐 보따리] 넷플릭스 <데이비드 애튼버러: 생명의 색을 찾아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우리는 동물들의 색깔 사용법과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를 잘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사실적 지식을 확인하고, 기존 지식과 신선한 지식의 관계를 구조화해 나가는 통상적 의미의 배움 즉 '지식축적'의 뜻으로만 정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보다는, 생명에 대한 동물들의 관점과 자세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사색하며 겸손히 학습하며 되새기는 활동에 가깝다. <논어>의 첫 문장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가 가리키는 "학(學)"의 활동 즉 전인적(全人的, holistic) 배움이 <데이비드 애튼버러: 생명의 색을 찾아서>를 관람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 안에서 시나브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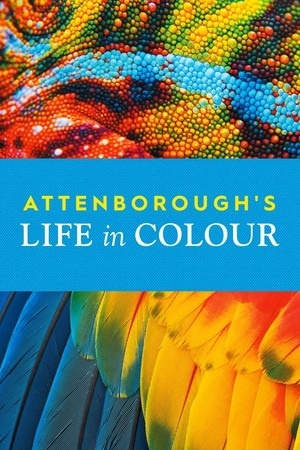
▲ 영화 포스터 <생명의 색을 찾아서> ⓒ 넷플릭스
아마도 처음엔, 그러니까 동물과 색깔의 관계를 관찰하며 모종의 배움을 제안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쓰윽 훑어볼 땐, 무심결에 선입견이 떠올랐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벼운 선입견이 아닐까 싶다. 동물이 색깔을 사용한다면 어차피 짝짓기, 보호색 같은 분야에 쓰겠지, 동물에게 딱히 무슨, 달리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겠어?
그 같은 선입견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덜 자극적이며 더 사색적인 이 작품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차피, 동물에게 딱히 무슨, 달리 고차원적인?"이라는 선입견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본능의 차원에서 색깔을 활용하는 행동이 꼭 하등한 것인가? 인간은 색깔을 얼마나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길래?'와 같은 신중한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게 된다.

▲ 스크린샷 화려한 색을 뽐내는 새들 곁에 서있는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 ⓒ 넷플릭스
영국의 연륜 있는 방송인이자 동물학자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Sir. David Attenborough)은 평생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공개된 순서대로 볼 때 그의 첫 번째 작품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생물다양성을 역설한 <데이비드 애튼버러: 우리의 지구를 위하여(A Life on Our Planet)>다. 참고로, '환경 다큐 보따리(http://omn.kr/1rwf4)' 연재의 지난 글 목록에서 해당작품의 리뷰를 읽을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다.
며칠 더 지나면(2021년 5월 8일) 95세에 도달하는 애튼버러 경은 자신의 이름을 건 두 번째 프로젝트로 '색깔'을 선택했다. 그는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색깔과 생명의 관계를 섬세하게 조사하여 <생명의 색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애튼버러 경이 직접 내레이션을 맡은 이 작품은 3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편당 상영시간은 약 40~50분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동물이 색깔을 보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특수기술을 적용한 카메라를 사용했다. 그리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동물 모형에 서로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가며 몇 가지 실험을 실행했다. 그뿐 아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카메라 옆에 납작 엎드려 꼼짝 않고 몇 시간씩 동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다큐멘터리 시청자들은 동물들의 신묘한 색깔세계에 편안하게 들어설 수 있다.
종(species)의 보전을 위하여
신묘한 색깔세계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동물은 공작이다. 공작이 마치 부채춤을 추듯 날개를 쫘악 펼치면 빛나는 눈동자 무늬들이 넓게 나타난다. 날개를 크고 탐스럽게 가꾸는 공작은 수컷인데, 거대하고 아름다운 색을 품은 공작의 날개는 짝짓기에 유리하다. 그렇지만 그런 날개는 상당히 무겁다. 그런 날개로는 높이 날기가 어려우며, 걸음속도도 느리다. 그럼에도 수컷 공작은 현재 자기자신의 삶보다 자손 대대로 '공작 종(species)'이 유지되기를 소망하기에, 짝짓기 성공률을 높여주는 무거운 날개를 유지보전하느라 고통을 무릅쓰고, 온 정성과 수고를 감당한다.
짝짓기 성공률을 높여주는 색깔 연출을 위하여 다만 수고스러운 정도를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동물들도 있다. 벌새나 극락조가 사용하는 색깔은 암컷에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포식자에게도 꽤 매력적이다. 따라서 까딱 잘못하면 짝짓기 장면은 삽시간에 식사 장면이 되고 만다.
색깔을 사용해 짝짓기를 진행하는 동물들은 이들 외에도 많다. <생명의 색을 찾아서>는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들이 동물들의 짝짓기에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보여준다. 그중엔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절대 인간의 눈에 접수되지 않는 특별한 색깔들(보라색의 바깥색-자외선, 혹은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편광)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동물들도 있다.
그런데, 선명한 색깔을 활용하는 짝짓기는 종 전체로 보면 유익한 활동이지만, 개별개체로 보면 지극히 위험한 활동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동물들은 자기자신이라는 개체 하나의 생존보다 짝짓기를 통한 종의 보전에 더 무게를 둔다.
이건 이기주의(egoism)의 반의어 이타주의(altruism)를 연상케 할 뿐 아니라, 부성애(father's love)를 넘어 거의 동포애(fraternity)의 구현이라고 할 만하다. 자기자신이라는 개체 하나보다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아가 세계 전체의 균형을 사랑하는 정신구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정신구조를 '본능'으로 장착하고 태어나 그 본능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사는 동물들을 두고 인간보다 저차원적이며, 또 하등하다고 간단히 말해도 되는 걸까? 아닌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생명의 색을 찾아서>를 보다 보면, 자신이 속한 종 전체를 조망하며 개별개체인 자신을 항상 검토하는 동물들의 삶을 함부로 하대하는 게 괜찮은 일일까 진심으로 생각해보게 된다.
보호 혹은 경고를 위하여
동물들의 색깔 사용법 중엔 예상했던 대로 보호색 사용법이 있다. 동물이 선택하는 보호색은 매우 다양하다. 오색달팽이는 껍데기의 색깔과 무늬가 거의 개체마다 다른데, 이는 색깔에 민감한 포식자(새)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다. 어제 포식했던 오색달팽이와 모양만 비슷할 뿐 색깔과 무늬가 완전히 다른 오색달팽이가 눈앞에 나타나면 포식자는 먹잇감인지 아닌지 흠칫, 당황하기 시작한다. 포식자의 기억 속 먹잇감과 다르게 생기기, 오색달팽이는 바로 그걸 노렸다.
다음으로, 얼룩말이 노리는 것은 오색달팽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얼룩말의 선명한 흑백 줄무늬는 사실 초록평원에서 눈에 잘 띈다. 어쩌자고 저렇게 눈에 확 띄는 무늬를 갖고 살아가는가, 걱정이 될 정도다. 그런데, 얼룩말은 태연하다. 포식자가 얼룩말을 향해 돌진하면서 그 선명한 흑백 줄무늬에 집중하다 보면 갑자기 어지러워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맹렬한 추격자 치타 앞에서 얼룩말은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면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치타 중에서 특히 어지러움증에 취약한 녀석은 제풀에 추격을 포기하고 나가떨어진다. 또, 얼룩말의 흑백 줄무늬는 파리 떼의 거리감각을 교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인가 싶어 내려앉으려 했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의혹을 품게 된 파리 떼는 다른 민무늬 동물들에게로 방향을 돌린다. 얼룩말들은 꼬리를 힘주어 흔들며 파리 떼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서서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어도 성가신 파리 떼가 알아서 사라져준다.
한편 독성물질을 상징하는 색깔들을 활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독도 없으면서 그걸 벤치마킹하는 녀석들도 있다. 예컨대 독이 있는 나비 날개의 색 조합(빨강, 노랑, 검정)을 모방한 독 없는 나비가 그 옆에서 태연히 자기 날개를 펼치고 앉아있는 장면에 이르면(2화: 색에 숨다, 아래 사진), 저 녀석을 귀엽다 해야 할지, 영악하다 해야 할지, 뻔뻔스럽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 스크린샷 오른쪽 위의 나비는 독이 있는 나비, 왼쪽 아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나비는 독이 없는 나비(비슷하게 생겼지만 위험성은 천양지차) ⓒ 넷플릭스
색깔을 다만 보호뿐 아니라, 경고 및 저항의 활동에 사용하는 동물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녀석은 산호초다. 바닷물 속에 사는 산호초는 광합성을 잘하는 조류와 공생하며 엄청난 크기로 몸집을 불려 나간다. 대기권 바깥에서도 바닷속 산호초의 거대한 군집이 보인다 하니 대단한 재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산호초는 바닷물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공생하던 조류를 내쫓는다. 바닷물 온도가 높을 때 공생조류들이 독성화학물질을 내뿜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조류가 다 방출되면 산호초는 하얗게 변색된다. 순백의 산호초는 얼핏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백골이다. 백골의 다음 단계는 소멸 곧 죽음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떤 산호초들은 공생조류를 몽땅 내보내지 않고, 자외선차단제(일종의 썬크림)를 발라 그들을 짐짓 지켜주기도 한다.

▲ 스크린샷 썬크림을 바른 산호초 ⓒ 넷플릭스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산호초는 단숨에 백골이 되는 게 아니라 임시로 형광색 피부를 뒤집어쓰고 일시적으로 뜨거운 바닷물을 견뎌낸다. 그러므로 형광으로 변색된 산호초를 보면서 "어머 예쁘다"라고 탄성을 지를 일이 아니다. 반짝반짝 극도로 아름다운 방식으로 저항하는 산호초의 궁여지책을 이해하고, 바닷물 온도를 낮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방안을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다. 산호초의 자외선차단제는 임시방편이어서,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 그것마저도 소용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3화: 색을 쫓다).
동물과 색깔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생명의 색을 찾아서>의 영어제목은 "Life in Colour"다. 색깔 안에서 생명을 느끼자는 제안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녀석이 어떤 색깔로 자기를 보호하는지, 은둔하는지, 짝짓기에 성공하는지, 그런 분류적 지식을 일일이 배우고 익히자는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동물들의 색깔 사용법의 핵심에 '생명존중 사상'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는 진실을 배우면 참 좋겠다. 백 살을 바라보는 노구의 애튼버러 경도 바로 그 진실을 작품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짚어주고 있으니, 그 배움은 그리 어렵거나 난해하지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