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대 규모 미술품 도난 사건의 막전막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이것은 강도다: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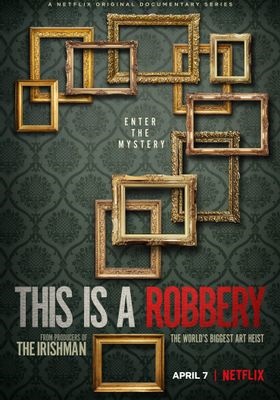
▲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이것은 강도다> 포스터. ⓒ 넷플릭스
1990년 3월 18일 이른 새벽, 미국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미술품이 도난당한다. 아일랜드의 최대 명절이자 미국에선 뉴욕과 보스턴에서 크게 열리는 '성 패트릭의 날' 주말에 일어난 희대의 대사건으로, 도난당한 미술품의 가치를 말하자면 현재의 감정가로는 5억 달러에 육박하고 당시에만도 2억 달러에 육박했다. 하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술품 도난 사건으로 일컬어진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도난당한 미술품을 만든 이의 네임벨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히 전설적인 거장들인데 렘브란트, 페이메이르, 마네, 드가 등이 그들이다. 박물관 측은 10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만한 정도의 작품들은 뒷거래로도 팔기 힘들었을 터, 범인은 도대체 왜 이 작품들을 훔친 걸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것은 강도다: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이하, '이것은 강도다')은 이 사건의 아주 자세한 막전막후를 다룬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제 용의자들은 거의 생존해 있지 않고 직접적인 관련자들도 나이가 많이 든 상황, 범인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니와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걸까?
용의자들에게 의아한 점
사건의 용의자는 2명으로, 경찰로 위장해 유유자적 박물관 내부로 침투했다. 그들은 야간에 박물관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을 포박하곤, 81분 동안 여기저기를 돌며 13개의 작품을 훔쳐 달아났다. 의아한 건 작품을 다루는 솜씨와 작품을 보는 눈인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역사적이거니와 고가의 작품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액자에 있는 그림을 뒤에서 빼낸 게 아니라 앞에서 칼로 잘라 꺼내 버렸다든지 말이다. 렘브란트의 유일한 바다 풍경화인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 그렇게 액자에서 마구잡이로 잘려졌다. 이 작품은 13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통하며, 미술 역사상으로도 진귀하게 취급받는다.
지금껏 남겨져 전해지는 게 30점 남짓할 정도로 적은 페이메이르 작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도 뼈아프게 다가온다. 반면, 다소 가치가 떨어지는 중국 고대 화병이나 나폴레옹 시대 청동 깃대 장식 등도 가져갔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눈속임을 위한 술수인가, 범인들의 취향인가, 클라이언트의 요구인가. 알 도리는 없다.
박물관 안팎을 오가는 수사의 초점
그토록 대단한 작품들을 다수 소유한 박물관이 단 두 명에게 그리 쉽게 털렸다는 게 믿기 힘들다. 이 생각은 당시에도 팽배했나 보다. 하여 수사 초반엔 초점이 박물관 내부에 맞춰지기도 하는데, 다름 아닌 범죄 당시 야간 경비를 섰던 릭 애바스였다. 그는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평소에도 자주 약에 취해 일을 하곤 했는데, 그날도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한다. 경계해야 할 대상을 경계하지 않는 일이 허다했고, 그날도 한밤중의 수상쩍은 두 명의 경찰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의 평소 행적을 문제 삼기보다 두 명의 범인이 박물관 내부에 들어와서 도난질을 한 행적을 보고 그를 의심했다.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바, 박물관 관계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을 비밀 통로가 열려져 있다든지 하는 정황과 경보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를 일촉측발의 상황에서 유유자적하게 움직인 범인들의 행동을 포착했던 것이다. 하지만, 릭 애바스를 내부 조력자라고 판단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어 수사의 초점은 박물관 밖으로 뻗어나간다. 작품의 초점도 함께 박물관 밖으로 향한다. 당시 보스턴에선 마피아가 날뛰었는데 보다 못한 수사당국이 매우 강력히 압박했고, 마피아들은 거래가 아닌 협상 카드로 미술품을 훔치곤 했던 것이다. 당대 유명한 강도 '마일스 코너'가 미술품을 훔쳐 협상 카드로 쓴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가 사건 당시 수감 중이이어서 제외된다. 직접 인터뷰에 응해 많은 이야기를 건네며 작품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 그다.
보스턴 마피아를 깊이 파고들다
작품은 본격적으로 보스턴 마피아를 파고드는데, 진정 들여다보려 했던 게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 미술품 도난 사건이 아니라 1990년대 보스턴 마피아의 모든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자세하다. 아마 감독은 이 사건의 뒤에 보스턴 마피아가 있었을 거라 거의 확신한 게 아닌가 싶다.
문제라면 문제랄 수 있는 건, 보스턴 마피아를 깊이 파고든 만큼 실속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보스턴 마피아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들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차리기에도 너무 복잡했거니와 자연스레 이 사건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던 것이다. 영화로 보면 케이퍼 무비 또는 하이스트 무비에서 시작해 갱스터 무비 또는 범죄 영화로 바뀐 것인데, 하위 장르에서 상위 장르로 가 버리니 재미도 덜해지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할까.
물론 큰 틀에선 모든 게 한 사건으로 귀착될 테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재미 없으며 지루하기까지 하니 어찌 아쉽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남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누구나 다 검색만 하면 아는 사실을 새삼스레 정확히 알게 된 건 그렇다 치고, 하다 못해 이 사건을 통해 시덥잖은 교훈 하나 얻을 수 없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술품 도난 사건에서 말이다.
나름의 통찰력을 발휘해 얻을 수 있는 걸 나열해 본다. 일차원적일지라도 어쩔 수 없다. 인류의 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박물관의 믿을 수 없는 허술함이 낳은 참사, 인류의 자산이 도난당한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수사당국의 대처가 낳은 참사, 인류의 자산을 어떻게 생각하는 알 도리가 없을 정도로 막장인 범인들의 낳은 참사. 이런 사건은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총체적 난국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





